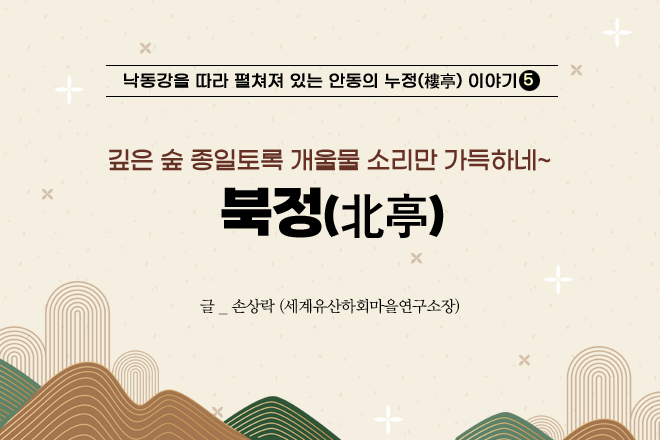
누정을 돌아보면, 살림집과는 달리 채우지 않고 텅 비어 있다. 이는 누정이 살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쉬고, 놀고, 시를 짓고, 술 마시고, 풍경과 사람의 품격에 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번잡한 일상에서 물러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바람과 달도 쉬어가게 만든 공간이다. 그곳에서 선비들은 비운만큼 채운다는 말과 같이 세속에서 부린 티끌만 한 욕심마저도 내 던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귀거래(歸去來)의 삶을 누리고자 했다. 또 누정을 바닥보다 높다랗게 올려 짓는 것은 강가나 산언덕이나 원림보다 한 단 더 높은 곳에 지어 그 높이를 포함한 정신적 경지에서 노니는 이상세계를 염원했기 때문이다.
고성 이씨 탑동파종택이다. 북정은 종택에 딸린 정자로 종택 옆으로 난 계곡을 따라 백여보 오르면 만날 수 있다.
정자로 오르며 담장 너머로 보이는 종가의 규모에 놀라고 화사하게 핀 봄꽃들이 종택의 권위와 묘하게 대조를 이루며 길손을 반긴다.
누정에서의 생활은 한낮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주변이 물속처럼 고요할 때면 풍류객들은 정자 위에서 오수(午睡)를 즐겼고, 달 밝은 밤이면 난간에 의지하여 달과 교감하는 풍류에 젖기도 했다. 때로는 지인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고, 취흥(醉興)이 시흥(詩興)으로 이어지면 유현한 문학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했다. 선비들은 누각에서 낮잠 자기를 즐겼는데, 그들에게 낮잠은 밤잠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잠은 인간의 습성화된 생리현상 그 이상의 의미가 없지만 낮잠은 꿈에 나비가 되어 날아다닌 장자(莊子)의 호접몽(胡蝶夢)처럼 세상의 영욕을 잊고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세계로 잠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낮잠은 잔다고 하지 않고 즐긴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또 달뜨는 밤에 맑은 바람 쐬며 명월을 감상하는 데도 누정만 한 곳이 없다.
누정은 때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는 집단 풍류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지방 유지들은 누각에서 계회나 연회를 베풀면서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내세웠다. 연회를 통해 마음을 유쾌하게 하면 화기(和氣)에 의해 정신이 맑아지고, 사리분별이 공평해져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마땅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탁의 구별을 엄정히 하고, 정도를 잃지 않게 되므로 결국 그 혜택이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누정은 대자연과 함께하는 고상한 모임의 장소였으며, 독서 취미와 유거(幽居)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은거지였고, 문학의 산실이자 개인과 집단 풍류의 주 무대였다. 한 마디로 누정은 선비들의 정신적 휴식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쉼 문화의 중심이었다.
영남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북정은 고성이씨탑동파종택에 딸린 정자이다.
오늘 찾아가는 북정은 안동시 법흥동 ‘고성 이씨 탑동파종택’에 딸린 정자이다. 탑동파종택은 안동 시내에서 아주 가깝고, 이웃한 곳에 석주 이상룡 선생의 종택인 임청각이 있으며, 종택 앞에는 법흥사지 7층 전탑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정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정자가 눈에 띄게 드러난 곳에 있지도 않고 종택 옆의 작은 계곡을 따라 백 여장 올라가야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바로 옆에 있는 임청각에 딸린 군자정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 북정은 조선 후기의 인물인 진사 이종주(李宗周, 1753~1818)의 호이자 정자 이름이다. 이종주의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자는 춘백(春伯)이며 호는 북정(北亭) 또는 치헌(癡軒)이다.
1802년 이종주는 마루 1칸, 방 1칸의 띠풀 집을 지어 북정이라 이름하고 자신의 호(號)로 삼았다. 선생은 정자의 이름을 북정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삶의 태도와 연관 지어 정자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당호를 적은 편액을 게첨하지 않은 연유를 밝히고 있다. 기문에 따르면, ‘북’은 겨울의 방위이다. 만물이 북에서 머무르고, 곧고 굳음도 북에 있다. 머무르면 반드시 흥함이 있고, 곧고 굳으면 반드시 풀려서 발함이 있게 된다. 저 동남서쪽의 생장과 완성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북방의 쌓이고 저장된 것에서 힘입지 않았는가! 이것이 나의 정자에 ‘북’으로 이름 지은 까닭이니 그 뜻을 취함은 깊도다.”
뒤에서 본 북정의 모습이다. 여느 정자와 달리 앞쪽도 답답할 만큼 꽉 막혀 있는 곳에 터 잡았다.
기문의 설명이 아니어도 당호를 북정이라고 한 연유는 지금의 북정 모습 그 자체가 북정을 건립하게 된 배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북정을 답사해보면, 밝고 생동감 넘치며 주변 경관을 즐기기에 좋은 곳을 택하지 않고 남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곳을 선택한 선생의 고뇌를 느낄 수 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외진 곳에 북정을 지은 까닭을 이해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나 꺼리는 춥고 어두운 북방을 지켜내고 견뎌내어야만 밝고 빛나는 다른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선생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는다.
초기의 정자는 방 1칸, 마루 1칸으로 된 띠풀 집이었다고 한다.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 23년 되던 해인 1840년(헌종 6)에 현재의 규모로 중건했다. 이종주가 1802년에 처음 지을 때는 당호를 붙이지 않았으나, 1840년 오늘날과 같은 모양으로 중건할 때, 면재(俛齋) 이병운(李秉運, 1766∼1841)은 「북정시후소서(北亭詩後小序)」란 글에서 북쪽 방을 혼혼(混混), 남쪽 방을 약무(若無), 대청을 허엄(虛厂)이라 쓰는 것이 고인이 된 북정 이종주의 뜻에 맞는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정자에는 선생의 뜻을 받들어 그러한 당호가 붙어 있지 않다.
북정의 건축적 특징은 자신의 집 북쪽 계곡 외진 곳에 작은 띠풀집의 정자만 지었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건물은 세우지 않았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외진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폐쇄적 공간’을 지향한 배치 구조이고 최소한의 인공을 가한 축소지향의 정자이다. 평면구성은 서쪽에 흐르는 계곡을 향하여 지었는데, 가운데 마루 1칸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각 1칸씩 배치하여 ‘一’자형의 구조이다. 어칸인 마루에서 앞으로 누마루 1칸을 돌출시켰다. 누마루 3면에는 난간을 돌려 양옆의 쪽마루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 북정의 평면구성은 영남산을 등으로 계곡을 향해 ‘丁’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폐쇄되고 외진 주변 경관에 비례한 ‘임청각 군자정의 변주된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안동박물관에 근무할 때 찾은 북정은 누마루에 당호 편액과 시판이 게첨되어 있었다. 시판은 이종주가 ‘족형(族兄) 유하옹(柳下翁) 이주세(李周世, 1742∼1824)와 대계(大溪) 이주정(李周禎, 1750∼1818) 형이 북정에 대해 지은 시 두 수를 보내준 것에 삼가 차운한다.’는 제목의 5언 시 한 수와 7언 시 한 수를 새긴 시판이 걸려 있었는데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찾은 북정은 당호 편액과 시판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깊은 숲 종일토록 아무 소리 없더니 / 深林終日寂無聽
개울물 소리만 작은 정자에 가득하네 / 除有泉聲滿小亭
땅은 도심에 접해 저자가 아주 가깝고 / 地接雄都偏近市
하늘은 첩첩한 묏부리로 병풍을 이루었네 / 天將疊嶂故爲屛
나이가 들어 머리털은 희어졌지만 / 年華已晩頭仍白
친구를 대하니 눈이 문득 푸르러졌구나 / 親友相逢眼却靑
웃으며 시냇가에 복사꽃나무 심어서 / 笑向溪邊種桃樹
고기 잡은 아이가 복사꽃 향기 좇는지를 지켜보리라 / 試看漁子逐殘馨 |
북정은 고성 이씨 탑동파(塔洞派) 종택에 딸린 정자이다. 종택은 임청각(李洺)의 현손 이적(李適, 탑동파 파조)의 증손인 이후식(李後植)이 1685년 안채를 건축하고 그의 손자 이원미(李元美)가 사랑채와 대청(永慕堂)을 완성했다. 종택 앞에는 국보 제16호 법흥사지 7층 전탑이 있다. 북정은 영모당의 후원과 영남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종택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또 연못과 화단 등을 조성해 도심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속진을 벗어난 한적한 산간 저택의 정취를 자아낸다. 1824년에 대수리를 했고, 1991년 정침을 개축했다. 연못 뒤에 보이는 건물은 별당형식으로 당호는 영모당(永慕堂)이다. 종택을 가로막고 있던 중앙선 철길이 옮겨가고 철거되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흥사지 7층 전탑과 고성 이씨 탑동파 종택, 영모당
누정을 돌아보면, 살림집과는 달리 채우지 않고 텅 비어 있다. 이는 누정이 살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쉬고, 놀고, 시를 짓고, 술 마시고, 풍경과 사람의 품격에 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