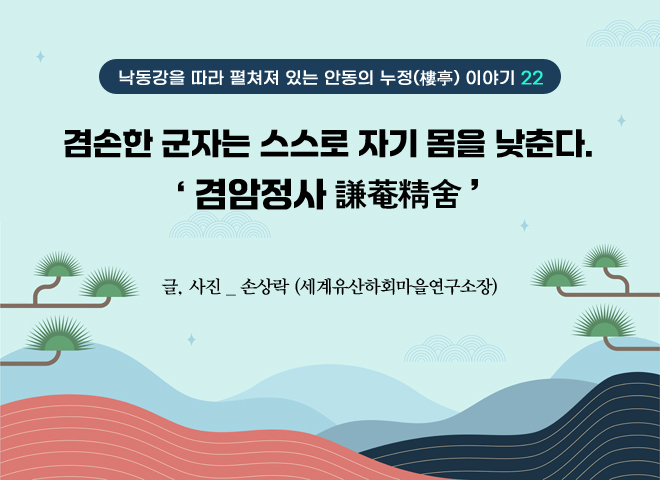
겸암정사는 부용대의 서편 강물이 크게 감돌아 굽이치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겸암정사를 찾아가는 길은 풍천면 소재지에서 일직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를 이용하여 광덕교를 지나 곧바로 좌회전하면 화천서원을 만난다. 서원을 둘러본 후 ‘부용대 450보’라고 적힌 표지판을 뒤로하고 산길로 접어들면 부용대 정상에 오른다. 부용대에서 바라보는 하회마을은 환상적이며 신비감마저 자아낸다. 하회의 지형이 산과 물이 어우러져 태극을 이룬 것과 한 송이 연꽃이 물 위에 피어있는 형국 등 하회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용대 정상에서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겸암정사를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길은 부용대를 넘지 않고 곧바로 찾아가는 길이다. 광덕교를 지나 화천서원으로 좌회전하지 않고 500여 미터 곧장 나아가면 왼편에 겸암정사를 알리는 푯돌이 있고 이곳에서 화살표를 따라 들어가면 곧바로 겸암정사를 만날 수 있다.
겸암정사를 위에서 내려다봤다. 앞쪽 건물이 겸암정사이고 뒤편은 안채이다.
이 정사를 지은 사람은 서애 선생의 형님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이다. 선생은 동생 서애의 현달과 달리 향리에서 자제들 훈도에 전념하고 부모 봉양에 진력한다. 겸암은 15세에 스승인 퇴계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에 힘썼으며 선생께서 향리인 도산에 서당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배움을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계 또한 그의 학문적 재질과 성실한 자질에 감복하여 총애가 끊이지 않았다. 선생의 나이 29세 때인 1567년에 화천(花川) 건너 부용대의 서편에 정사를 짓고 학문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는데, 스승인 퇴계는 주역의 겸괘(謙卦)에 형상하기를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춘다는 뜻이 담긴 ‘겸암정(謙菴亭)’이라는 현판을 써주며 ‘그대가 새집을 잘 지었다는데(聞君構得新齋好), 가서 같이 앉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해 아쉽네(欲去同牀恨未如)’라는 편지글을 적어주기도 하였다. 겸암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 자신의 호로 삼았다. 정사에 걸려있는 ‘겸암정’이란 현판은 스승인 퇴계 선생의 친필이며, 겸암정사(謙嵓精舍)라는 현판은 원진해(元振海)가 9세 때에 쓴 것이라 전한다. 이 현판은 선생의 6대손인 양진당 류영 선생이 겸암정사를 중수할 때 찾아서 걸었다고 전한다.
하회마을에서 바라본 겸암정사, 부용대의 서쪽 끝에 살포시 내려앉은 정사가 고즈넉하다.
겸암정사는 선생께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 양성에 힘쓴 곳이다. 따라서 정자의 일반적인 기능이 산수 좋고 풍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데 있다면 겸암정사는 몸을 쉬며 풍광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예사 정자와는 달리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을 담당하는 서당의 구실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성과 배치도 이와 같은 기능이 잘 반영되어 있다. 건축물의 구성은 ‘一’자형의 겹집인 정사와 ‘ㄱ’자형의 홑 집인 안채가 절벽 위 촉박한 터전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채는 정자의 뒤쪽에 자리 잡아 정자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사랑채와 강학 공간의 역할을 하는 정자와 살림을 담당하는 안채가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이곳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생활을 보살펴줌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는 가운데 마음을 닦고 도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랑채 격인 정사는 겹집으로 ‘一’자형의 8칸 집인데 앞 퇴 부분을 다락집 형으로 높여서 구조하는 특색을 지녔다. 자연석을 다듬어 기단을 조성한 후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다. 누하주와 누상주의 굵기는 비슷하다. 지붕은 팔작지붕에 홑처마로 지어 소박하다. 평면의 구성은 정사를 바라보면서 왼편부터 구들 놓은 2칸 통의 방을 드리고 그다음 우물마루로 깐 대청 4칸을 가운데 놓고 오른편에 1칸 방과 그 앞에 1칸의 마루를 배치하여 전체 8칸의 규모이다. 왼편 방에는 암수재(闇修齋조용히 닦는 곳)란 현판을 걸고 오른편 방에는 강습재(講習齋: 강설하고 익히는 곳)란 현판을 걸었다. 정사의 전면과 좌우 측면은 쪽마루를 돌리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각 공간으로의 출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겸암정사의 옆모습이다. 화천을 앞에 두고 건너편 만송정과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루에서 올려다보는 천장은 연등천장의 양식을 따서 서까래와 대들보, 종보, 대공 등의 목재를 결구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들보 위에 올린 종량이 거의 대들보에 밀착된 듯이 보인다. 휘어진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들보가 종보를 받는 부분을 고려하였다. 그 노력으로 중대공을 따로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도 가구를 결구하는 멋을 부렸다. 대청에 겸암정, 겸암정사의 현판이 걸려있으며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선생이 창건 유래를 자세하게 기록한 기문이 함께 걸려 있다.
안채의 편액은 허수료(虛受寮)이다. 살림집의 안채가 아니라 강당에 부수된 요사로 왕래하는 이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조영되었다. 평면이 ‘ㄱ’자형이고 둥근 기둥을 사용하여 건물의 인상이 당당하고 활달하다. 다듬은 자연석을 정갈하게 쌓아 올려 높은 죽담을 조성하고 역시 자연석으로 초석을 놓았다. 지붕의 형태는 팔작집이다. 평면의 구성은 왼편부터 부엌 1칸, 앞퇴가 있는 방이 2칸, 대청 2칸을 구성하고, 이어 2칸 통의 건넌방, ‘ㄱ’자로 꺾이는 동쪽 날개에 2칸의 홑 곁방과 반 칸의 내루(內樓)를 배치하였다. 반 칸 크기인 내루는 기둥 밖으로 다시 반 칸을 돌출시켜 결국 1칸의 크기인데 이곳에도 난간을 부설하여 마무리하였다. 이 부분의 구조는 이 집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내루 처마에는 겸암정강수계(謙嵓亭講修稧)를 적은 현판이 걸려 있다. 강수계의 내용은 강도수덕(講道修德: 도리를 강론하고 덕을 닦는다), 강신수의(講信修義: 믿음을 강론하고 의리를 닦는다), 강척수의(講戚修誼: 친족의 도리를 강론하고 우의를 닦는다)이다. 안채 내루와 겸암정사 사이의 간격에 낮은 맞담을 쳤다. 산의 작은 돌과 기와편으로 무늬를 구성한 토담인데 중앙에 일각문을 내고 이곳을 통하여 안채의 내정(內庭)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형님 정자 지어 / 我兄遺亭館
겸암이라 오랜 이름 붙였네. / 謙巖有舊名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어내리고 / 竹影淨臨階
매화는 뜰 가득 피어있구나. / 梅花開滿庭
발끝에 향 그런 풀 냄새 모이고 / 遊從芳草合
호젓한 길엔 흰 안개 피어나네. / 仙路白雲生
그리움 눈물 되어 소리 없이 흐르니 / 愴憶空垂淚
강물도 소리 내어 밤새 흐르네. / 江流夜有聲
- 류성룡 -
겸암정사 안채 허수료이다.
겸암정에서 보이는 입암이다. 형제바위라고도 부른다.
겸암정에서 바라보는 만송정 솔숲 위로 이른 달이 떠오르고 있다.





